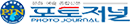김광수, 이갑철, 진동선, 최광호 초기 사진전
목련꽃 아래서
전시기간 : 2018년 7월 03일(화) ~ 2018년 7월 15일(일)
작가와의 : 만남 7월 7일(토) 오후 5시
장 소 : 류가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13-3(자하문로 106)

김광수, 이갑철, 진동선, 최광호. 지금은 사진가와 사진평론가로 저마다의 자리매김을 데뚝히 하고 있는 네 사람이지만, 이들에게도 ‘처음’은 있었다. 투박함과 서투름으로, 신선함과 맹렬함으로 혹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길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며, 어떤 경지(境地)를 갈망하던 ‘처음’. 스무 살 무렵부터 친구였고 신열 앓듯 함께 사진앓이를 했던 이 네 사람은 40년이 흐른 지금도 친구이며 여전히 사진을 살고 있다.
운 좋게도 우리는 그들의 ‘처음’이 현재로 불려나오는 광경을 오는 7월, 갤러리 류가헌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김광수, 이갑철, 진동선, 최광호 초기사진전 <목련꽃 아래서>.
<구름> 시리즈로 양명해진 김광수는, 그 작업으로 인해 ‘구름을 불러낼 줄도, 원하는 구름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는’ 작가라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사진을 처음 시작한 초기에는 ‘벽’만 찍었노라고 한 인터뷰에서 고백한 바 있다. 첫 개인전으로 선보인 것이 바로 그 <벽> 시리즈였다. “말하지 못하는 벽에 담긴 역사와 세월을 담고 싶었다”는 것이 당시 작가의 말이다. <구름>에서부터 최근 전시작 <Fantastic Reality>에 이르기까지 긴 변모의 과정 속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진 것이 바로 그 사물의 형태와 작용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김광수 식 시선일 것이다. ‘처음’은 ‘지금’과 이렇게나 닿아있다.

이갑철, 진동선, 최광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갑철은 “사진과 학생으로, 까르띠에 브레송과 게니 이노그랜드 등 대가들의 사진을 흉내 내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던 스무살 무렵의 사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갑철의 사진을 두고 ‘아름다운 거죽의 재현보다는 그 거죽 아래의 보이지 않는 어떤 힘과 기운을 끄집어내어 느끼게 해주는 데 진력한다’는 문화평론가 박명욱의 평처럼, 그 스무살 무렵에도 이갑철은 피사체 너머를 어렴풋하게 보고 있었다.
근원에 천착해 실험적인 작업을 해온 최광호 역시, 일찍부터 근원으로서의 자신과 주변부를 들여다보는 데 힘썼다.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십대 시절, 사진이 좋아서 매일 사진기를 들고 부둣가 등지를 쏘다니며 찍은 사진들과 78년도에 첫 개인전으로 선보인 ‘Self’ 사진들은 누가 보아도 최광호의 ‘처음’이다. 그 무렵에 직접 인화한 빈티지 사진들 20여 점이 <목련꽃 아래서>를 통해 선보여진다.

현재는 사진평론가로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진동선은 사진가에서 시작해 평론가가 되었다. 그는 사진가이던 1980년대 초에 재개발지역을 포함한 일상의 풍경들을 사진에 담았다. 이 사진이미지들은 “모든 존재는 존귀하며, 사진의 목적은 존재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하는 그의 사진론과 연결되어 있다.
<목련꽃 아래서>는 평창 다수리갤러리와의 교류전으로, 전시제목에 등장하는 목련꽃은 다수리의 폐교 교정에 서 있는 오래된 목련나무에서 비롯되었다. 지구상의 나무 중에 제일 처음 꽃을 피운 게 ‘목련’이라하니, 비록 목련꽃 없는 7월이라도 전시와 어울리는 제목이다. 40여 년 지기인 네 사람이 함께 모여 전시를 여는 것 또한 ‘처음’이다.
김광수
1979년 생명의 흔적을 주제로 한 <벽>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1996년 <구름>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정물> <나의 구름> <메모리> <구름의 정원> 등 다수의 전시를 이어오며 조형미가 두드러진 그만의 독특한 사진 스타일을 선보여 왔다.
이갑철 LEE GAP CHUL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며 선조들의 삶의 정한과 끈질긴 생명력을 사진에 담았다. 1988년 <타인의 땅>을 시작으로 <충돌과 반동> <Energy> 등 다수의 전시를 열었고 이명동사진상, 일본 사가미하라 아시아 사진가상 등을 수상했다.진동선
‘사진이 갖는 완벽한 시간의 알리바이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진가이며, 사진평론가 겸 전시기획자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2000년 광주비엔날레 전시팀장, 2008년 대구사진비엔날레 큐레이터, 2009년 울산국제사진페스티벌 총감독을 맡았고, <사진철학의 풍경들> <한 장의 사진미학> <한국 현대사진의 흐름>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최광호
살아온 걸음걸음이 모두 사진적 족적을 이루어 온 사진가다. 1978년 첫 개인전 이래 이어온 수많은 전시 이력이 깊이를 키워왔다면, 출판과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외연의 너비도 넓다. ‘사진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사진가’라고 불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진가 중 한 사람이다.
최광호와 친구들-사진7080

사진은 단 한번 일어난다.
단 한번 일어난 사건이다.
시작이면서 끝이고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다.
존재가 찰나 속에 드러낸 마지막 포즈의 모습이다.
사진은 이미지 이상의 많은 말을 숨긴다.
모든 사진가에 그 옛날의 시작은 있다.
첫 사랑 순정 같은 풋풋했던 시간이다.
돌아보면 열락에 들떴던 순수의 시절이다.
그래서 첫 시작은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지금’을 있게 한 존재증명서이기 때문이다.
<최광호와 친구들-사진7080>은 그런 전시이다.
그 시절을 건너온 동지애와 우애의 사진들이다.
그런 점에서 순수의 증표이기도 하고,
사진만을 사랑했던 무모함의 정표이기도 하고,
열정 하나로 덤벼들었던 열락의 낙인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금년 봄 최광호가 진행하는
평창 “다수리사진축제” 때 작은 기획전으로 나타났다.
그랬던 것이 류가헌과의 교류전으로 다시 선보여지는 것이다.
다수리 전시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다.
이 사진들이 어느덧 우리들의 존재의 뿌리라고
너무 멀리 와버린 시간의 회상이고
서로 이리 될 줄 모르고 시작한 무모함의 쓴웃음이고
살아보니, 적셔보니 어느 순간 깨달은 안도의 감사라고.
시간차는 있지만 70년대, 80년대 한국사진은 전성기였다.
가장 뜨거웠던 시절에 우리는 사진에 입문했고
가장 화려했던 시절에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했고
가장 풍요로운 시절에 저마다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달려온 시간들, 모습들,
사진으로 행복했고 친구여서 감사했던 날들이다.
그 모든 것들이 사진 속에 있다.
사진 앞에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왜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지
서로 웃고 놀라워하는 존재의 거울이다.
과거로 돌아가 세월을 뒤적거리는
아재들의 추억의 거울이다.